Editor’s Comment
2006년 디자이너 더글러스 바우먼은 구글에 합류하며, 시각디자인리더로서 팀을 꾸리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구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의 회사에서 전통적인 디자이너가 부딪힌 한계”를 소회한 글을 남겼죠. 물론 그가 떠난 당시의 구글과 지금의 구글은 다른 모습일 테지만, 여전히 디자이너 대 개발자, 디자이너 대 엔지니어 등 서로에 대한 몰이해의 일화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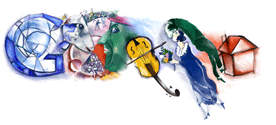
구글에서 시각디자인 팀을 이끌었던 더글라스 바우먼(Douglas Bowman)이 지난 주 금요일 구글을 떠났다. 구글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한 글을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엔지니어들의 회사에서 전통적인 디자이너가 부딪힌 한계”를 고백한다.
“엔지니어들이 가득한 회사에서는, 문제의 해결 방식 역시 공학적이다. 각각의 의사 결정은 단순한 논리 문제로 축소하고, 주관성을 일절 배제한 채 오로지 데이터만 들여다 보는 것이다. 데이터가 모든 의사 결정의 버팀목이 되면서, 대담한 디자인 의사결정을 가로막게 된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일화들을 덧붙인다. “그렇다. 구글 팀은 두 개의 파랑색 가운데 쉽사리 한 쪽을 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개의 파랑색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 파랑색 사이 41 단계 음영을 테스트한다. 최근 나는 테두리 선의 너비가 몇 픽셀이어야 하나, 3인가 4인가 아니면 5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내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작디 작은 결정들을 두고 논하는 일에 지쳐버렸다.”
하지만 “어느 색이 나은지 알아보기 위해 41개의 음영을 연구하는” 구글의 이러한 프로세스야말로, ‘구글다운’ 미덕이라 이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 디자이너는 구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현재 <코어77>을 비롯해, <CNet>, <기즈모도>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되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는 디자이너 개인의 직관과 과감한 도전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디자인 프로세스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면 다른 누군가는 집요하리만치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자인이야말로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할 것이다. 과연 좋은 디자인이란 데이터 속에 있을까, 아니면 디자이너의 머리 속에 있을까. 아니 이러한 양자택일의 질문은 과연 적절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를 잇는 가운데, 과연 3년 전 구글은 어떤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이너’를 영입하려 했던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궁금해진다.
via core77
ⓒ designflu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