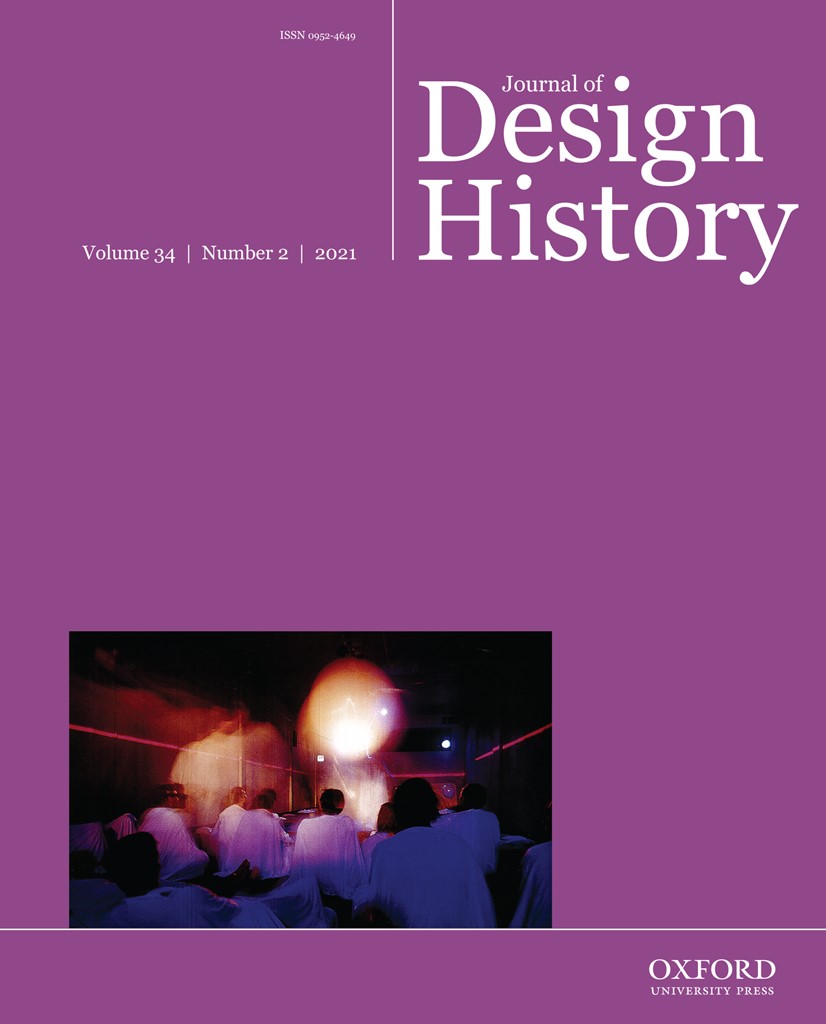
시각문화, 물질문화와 더불어 디자인사에 집중한 전문 학술지인 <저널 오브 디자인히스토리>. 매번 논문이 4편 정도 실리는데 이번 호에는 6편이나 된다. 가끔 ‘디자인사와 건축사의 관계’, ‘구술사와 디자인’ 같은 특별호가 발행되기도 하지만 이번 호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없다. (https://academic.oup.com/jdh/issue/34/2)
6편 중에서 눈에 띄는 논문을 살펴보자. 먼저, Olivia Armandroff의 <A Dentist’s Chair: For Practicality, Comfort, or Spectacle?>. 나처럼 치과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치과 의자를 누가 디자인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치과 의자의 원형은 치과 의사가 설계했다. 그리고 이것이 ‘안락 의자’(reclining chair)의 원형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전문직의 도구가 대량 생산품의 표준이 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세기 초의 세균 이론, 위생 문제 등 의자 디자인에 연결되는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30cm 정도 높이의 의자 모형을 발견하고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벨벳과 목재로 된 장식적인 의자 아래에 기계 장치가 달린 이 기괴한 모형은 치과 의사인 아이라 앨런 새먼(Ira Allen Salmon)이 1967년에 특허를 출원할 때 제출한 것이다.(당시에는 문서와 도면에 덧붙여 축소 모형을 제출해야 했다고 한다) 오래 전에는 치과 진료 행위가 야외에서 이뤄지다가 19세기가 되어서야 실내로 들어왔고 대학 교육과 학술지 발행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의 치과 의자라고 해야 가정용 의자를 개조한 수준이었고 새먼도 홈 퍼니처의 관행을 적용하다보니 그와 같은 기괴한 조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론에서 저자는 20세기 중반에 새로이 디자인된 모델이 등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치과 의자로 발전했지만 새먼이 의사의 전문 경험으로, 또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맞는 ‘편안함’을 제시하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논문인 Sonya Abrego의 <From Cattle Brand to Corporate Brand>는 리바이스(Levi’s), 리(Lee) 같은 대표적인 청바지 브랜드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다룬다. 특히, 물질문화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한때 소유를 구분 짓는 단순한 심벌이 어떻게 특정한 상품과 브랜드 로고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어떻게 미국 서부(the West)와 목가적인 생활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브랜드’라는 낱말 자체가 뜨겁게 달군 쇠로 가축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 청바지의 경우, 로고가 압인된 가죽 조각이 사람의 엉덩이 쪽 허리밴드에 달렸으니 브랜드의 기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낙인이 가축의 피부에서 패션 브랜드의 가죽 조각으로 전환된 것을 ‘기호 이동’(semiotic shift)이라고 표현한다.
두 회사 모두 19세기말에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리는 캔사스, 리바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다. 리는 그야말로 목장과 농촌의 작업자들을 위한 옷을 시작했기 때문에 ‘카우보이 바지’(Cowboy Pant)라는 이름을 붙였다. 허리밴드에는 털이 있는 가죽(hair on hide)에 정말로 뜨거운 쇠로 ‘Lee’ 로고를 낙인처럼 찍어냈다. 20세기 중반에는 미국 사회가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일’과 ‘레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했고 카우보이 이미지 뿐 아니라 가족이 모두 청바지를 입고 있는 낭만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한편, 리바이스는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맞는 또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즉, 목동, 농부가 아닌 ‘광부’에게 필요한 작업복답게 튼튼하고 실용적인 옷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다. 서부의 이미지를 사용하긴 했는데 오래된 서부(Old West)의 서사와 연결하고 20세기 중반에는 레저와 여행의 맥락에서 홍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는 두 브랜드의 행보가 비슷해졌다.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리벳 장식을 없애고 패턴을 단순화하는 등 기계 세탁에 맞게 디자인을 바꿨고 냉전 기간에는 서부의 카우보이를 낭만적으로 시각화해서 미국의 영웅적인 백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전통적인 이미지(친숙함)와 혁신적인 이미지(새로움)를 동시에 청바지 브랜드에 부여해 왔다. 결론에서 저자는 큰 변화 속에서도 캐틀 브랜드가 서부 버내큘러 모더니즘(Western vernacular modernism)으로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Judy Willcocks가 쓴 <Archives, Collections and Curatorship: Live Archive Projects in a Design History Learning Setting>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2013년부터 진행한 리서치 결과를 담은 것이다. 제목으로만 보면, 아카이브와 큐레이팅의 개념을 다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례 연구에 가깝다. 핵심은 디자인 교수법이 디자인 프로세스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그래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디자인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센트럴 스쿨 오브 아트 앤 크래프츠(Central School of Art and Crafts)의1950년대, 60년대 아카이브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칼리지 오브 아트 앤드 디자인(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CSM)으로 합병되어 있고 그 학교의 문화, 비평, 큐레이션 석사과정(MA in Culture, Criticism and Curation) 학생들이 자료 조사에 참여했다.
50년대부터 기초 디자인(Basic Design)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남긴 자료들이 대학 아카이브에 남아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 대부분 그렇듯 카탈로깅이 되지 않은 상태(uncataloged archive material)였다. 아카이빙 작업으로만 진행한다면 적절한 메타데이터로 분류했겠지만 논문의 저자와 학생들은 한걸음 나아가 디자인사 연구와 큐레이팅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즉, 50년대 영국의 예술 및 디자인 정책과 사건들에 연계된 지점들을 찾으면서 교수법의 변화와 학생들의 경험을 증언할 자료들을 해석해낸 것이다. 다른 학교에서도 시도해볼 법한데 문제는 수십 년 전의 자료까지 확보한 아카이브가 학교에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북 리뷰로 넘어가보자. 인물을 다룬 책이 몇 권 눈에 띈다. <Henry van de Velde: Designing Modernism>(Yale University Press, 2019)은 디자인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앙리 반 데 벨데의 폭넓은 활동작업, 즉 회화에서 디자인, 건축까지 영역을 넘나든 과정을 다룬다고 한다. <The Long Front of Culture: The Independent Group and Exhibition Design>(MIT Press, 2020)는 1950년대 영국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비평가 콜렉티브인 인디펜던트 그룹에 대한 책이다. 특히 그들이 전시 디자인을 예술적 매체로 활용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앞의 두 책에 비하면 다른 한 권은 동시대적인 인물을 다룬 책이다. <Mag Men: Fifty Years of Making Magazin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가 그것인데 제목 그대로 잡지를 만든 사람들, 즉 월터 버나드(Walter Bernard)와 밀턴 글레이저(Milton Glaser)의 이야기다. 지난 50년 동안 두 사람이 진행한 아트 디렉션과 디자인을 회고하는 이 책이 나온 지 몇 달 뒤에 밀턴 글레이저는 작고했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리뷰가 작성되었으니 각별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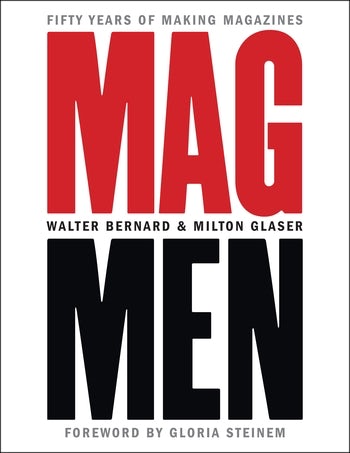
디자인사를 다루는 저널이다 보니 20세기의 사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다는 점은 연구자에게, 그리고 디자이너에게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소소한 지식을 얻는 기쁨도 있는데 이번 호만 하더라도 치과에 가거나 청바지를 입고 있을 때 옆 사람과 나눌 얘기가 생기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