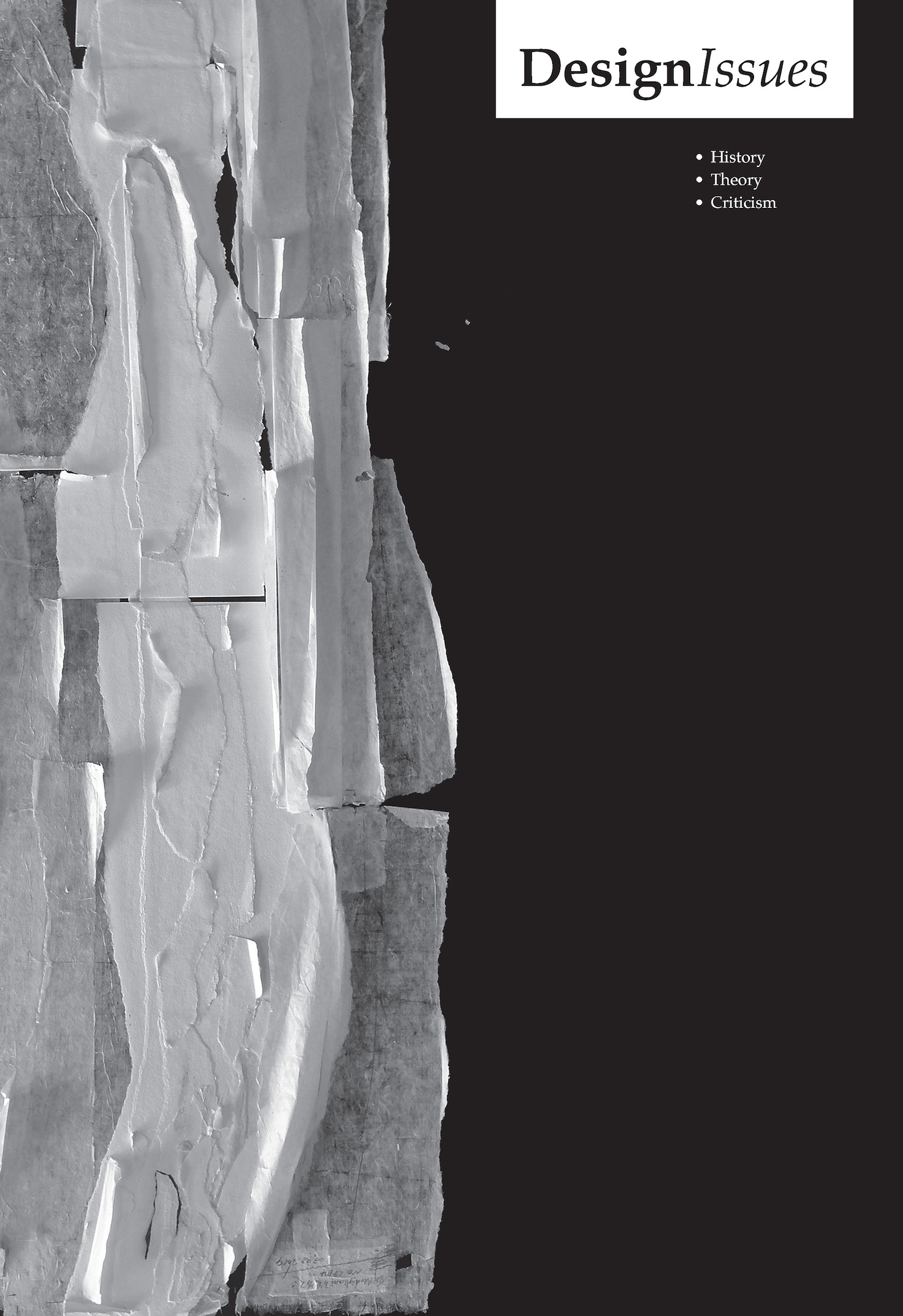
2021년 여름 <디자인 이슈>는 크게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관한 연구 세 편과 현실 정치(및 경제 politics and economy) 관련 글 세 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영수, 김미소의 공동 연구 ‘서비스의 시학: 경험의 시대, 만들기의 의미’가 자리한다.
‘미래의 패션: 패션, 젠더, 산업디자인의 전문화’(“Fashions of the Future”: Fashion, Gender,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Industrial Design)에서 저자 암스트롱은 2차 대전부터 전후 미국 사회 즉 소비문화가 고조되고 신국가주의(new nationalism)가 등장하던 시기에 산업디자인이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를 추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패션디자인이 어떻게 여성적, 아마추어 분야로 축소되었는지, 또 그 권력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얼마나 젠더 편향적이 되었는지 그 양상을 드러낸다. 이 변화의 분기점은 1939년 뉴욕국제박람회(New York World Fair). 여기에 패션 매거진 <보그>가 합세하여 당시 유망한 산업디자이너들과 손을 잡고 미래의 패션을 예견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 이 이벤트는 ‘진보’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대 산업 생산 구조에서 산업디자인이 이른바 ‘전문직’으로 인정될 것을 공식 제안한다.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패션 매체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이성-기술-전문성에 기반한 생산 분야로 부상하고, 상대적으로 패션이 자연/감성-아마추어(수동적 소비)라는 이미지로 스테레오타입화 되는 과정이 아이러니컬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 전문 산업디자이너 대 여성 패션 독자•소비자 사이의 경계를 극명하게 만드는 문화적 이미지 재현 생산 전략이 제대로 성공한 경우다. 이 글에서는 1939년 뉴욕국제박람회가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 프로모션을 위해 기획된 배경, 자영업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이 전문 직종으로 변화되는 법률적 변화 과정, 미국과 유럽에서 디자인 및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갈라지는 지점 등 풍부한 역사적 사실 정보를 함께 접할 수 있다.

인발 벤-아셔 기틀러와 에니나트 라초버의 연구 ‘젠더화된 기억과 미니어처 그래픽 디자인: 이스라엘 우표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Gendered Memory and Miniaturization in Graphic Design: Representations of Women on Israeli Postage Stamps)는 이스라엘 기념 우표에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페미니즘, 국가주의적 행동주의, 대중문화 운동이라는 문화 현상의 관점에서 여성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국가 주도로 생산되는 우표라는 매체를 통해, 디자인 이미지가 시오니즘적 이스라엘 헤게모니 안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적 편향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디자인이 사회정치적 매개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시대와 지역의 상황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어떤 분석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날카롭게 의미를 이끌어내는가일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두 저자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우표를 기호로 보고, 페미니즘 논의를 분석의 틀로 잡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표의 분석은 이미지 표현 방식(매체, 컬러, 크기, 인물의 시선 방향 등), 폰트, 이미지-텍스트 간의 구성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기호로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시각적 표현이 현재 페미니즘 논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의 입체적인 해석이 아쉽다. 시각 매체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해석을 기대하게 된다.
‘‘모노폴리’ 게임의 군사화: 전쟁과 게임 디자인’(Militarizing Monopoly: Game Design for Wartime)에서 저자 다이애나 가빈은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 2차 대전 중에 세계적으로 확산된 보드 게임 ‘모노폴리’(Monopoly)가 각국에서 정치적 의미를 만들어 나간 과정을 밝힌다. (103개국에서 37개 언어로 출시) 애초에 이 게임은 두 가지 대조적인 정치경제 논리로 개발되었다. 하나는 집단적 부의 분배를 통해 소수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를 독점하고 상대를 무너뜨림으로써 개인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저자는 이 중 두 번째 버전이 라이선스를 얻고, 1935년부터 영국,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치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라 디자인이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노폴리가 기차역을 중심으로 디자인 된 것과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들이 교통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을 반영하여 버스, 기차, 증기기관차 역과 공항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버전으로 디자인 된다. 저자는 파시트스 당파의 네트워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 버전이 이탈리아 외 동아프리카 국가에 파시스트 군부독재 체제를 선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례로 언급한다. 디자인이 생활 방식이나 개인/집단적 취향에 미치는 영향은 2차적인 현상이고, 근저에 정치경제 논리에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하게 된다.

이어지는 세 편의 글은 디자인이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지난 호에 이어, ‘전문회사의 디자인 – 파트2’(The Design of Firms: Part 2 – Competitive Advantage)에서는 제품 형태 생산에서 나아가 기업 내 의사 결정 과정에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한다. 매니지먼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패션 브랜드 ‘자라’(Zara)를 예로 들며, 제품 디자인과 함께 운송, 분배 시스템, 전략 디자인이 기업 전체 디자인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는 반 세기 전 엘리엇 노이에스가 IBM에서 추진했던 말 그대로의 통합적 ‘기업디자인’(corporate design)과 같은 맥락이지 않은가. 이 글은 바로 이 형태로 운영되는 이익 집단을 ‘디자인 전문회사’(design firm)로 정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제경영학자 기에르메 포울레 A. 몬테이루의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디자인 적용 방식’(The Use of Design in Business Strategy: What’s Beneath the Surface?)은 지금까지 진행된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형태 즉 비즈니스 전략으로서의 디자인(Design as Strategy)과 정반대되는 디자인으로서의 전략(Strategy as Design)을 제안한다. 이는 전략적 메타-능력으로서의 디자인(Design as a Strategic Meta-capability)이라는 시각에 기반한 것이다. 저자는 비즈니스 전략을 디자인의 일환으로 시각을 전환하면 기업의 가치 창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글이 기업/시장과 디자인에 관한 논의라면, 헬레나 폴라티 트리페의 ‘정책 도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서비스 디자인의 오브제’(Policy Instrumentation: The Object of Service Design in Policy Making)는 정부의 정책과 디자인의 관계를 조명한다. 몬테이루가 비즈니스 전략을 디자인의 한 과정으로 보듯이, 트리페는 정책의 결정을 디자인 프로세스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는 정책 수행자들 사이를 잇는 정책 도구가 필요한데, 저자는 서비스 디자인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유형이라고 본다.
디자인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디자인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시도하는 하나의 아티클을 만나게 된다. 이영수과 김미소는 ‘서비스의 시학: 경험의 시대, 만들기의 의미’(The Poetics of Service: Making in the Age of Experience)에서 서비스 디자인과 구매자 경험에 대해 물질적/경제적 차원이 아닌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기술(테크네 techne)이란 물질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로고스(이성, 질서 logos)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통해 상호 매개되는 지식”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들기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들은 이야기하기가 서비스 디자인의 생산-소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세운다. 요컨대, 무언가 디자인이 되면(만들어지면) 스토리가 펼쳐지고, 확장된 구매자 경험 안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구매자/사용자의 생각과 디자인 결과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두 저자는 서비스 디자인 경험과 스토리텔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 즉 물질, 효율, 목적(기능적 목적), 형식의 ‘궁극 목적’(causes)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둘째, 이 네 가지 궁극 목적을 ‘경험’이라는 다이내믹한 흐름으로 통합하는 ‘합성’(synthesis) 모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제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정보와 치밀한 논리에 기반하여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어서, 글의 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 저자는 이 글에서 언급되는 개념어들(합성 등)을 정확하게 정의한 후에 내용을 풀어낸다. 아울러 ‘시학’, ‘만들기’ 같은 개념들을 디자인사에서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왔는지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보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다.
이번 호의 서문을 돌이켜 보니 편집인들의 시각이 새삼 놀랍게 다가온다. “이번 호에서는 패션, 제품, 우표, 보드게임, 스토리텔링과 서비스, 기업 전략,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디자인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한다. 여러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디자인을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왜 새롭게 언급되어야 하는가? 디자인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보낸 그 긴 세월. 다학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고도 한 세대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디자인은 여전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https://direct.mit.edu/desi/issue/37/3
Prince
